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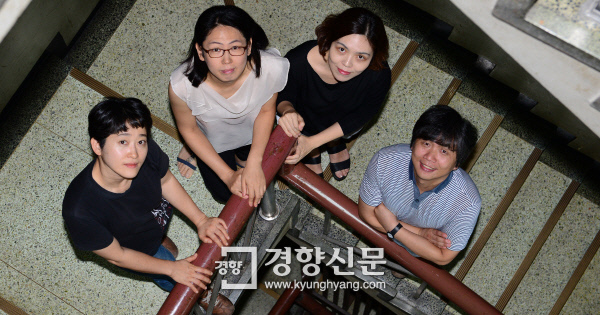
1988년. 고향을 떠나 서울의 온도계 공장에 취업한 15세 문송면군은 두 달 만에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전신발작까지 하게 된 그는 병원과 한의원을 전전했지만 누구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소년은 뒤늦게 한 의사로부터 “어디서 일하다 이렇게 됐니?”라는 질문을 받고서야 자신이 수은에 중독됐음을 알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산재를 인정받은 지 사흘 만에 그는 세상을 떴다.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에 들어간 노동자 12명이 4~5일 만에 발진과 구역질에 시달리다 쓰러졌다. 사측은 “먼지가 많아 피부병이 생긴 것”이라며 일정을 강행했다. 병원에선 식중독이나 몸살감기일 것이라 했다. 의사들도 21세기에 수은중독 환자를 다시 보게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수은중독임이 확인된 것은 철거가 끝난 지 6개월, 모두 다른 일자리를 찾아 흩어진 후였다.
문군의 죽음을 계기로 1995년 산업의학 전공이 도입되고 직업병 전문병원이 생겨났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상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시계는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휴대전화 부품을 만드는 삼성·LG전자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되거나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 19세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였다. 지난 5월1일 노동절에는 조선소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하청노동자 6명이 숨졌다. 그로부터 12일 뒤, 돼지분뇨를 처리하던 이주노동자 2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중독돼 사망했고, 보름 후 또 다른 이주노동자 2명도 같은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거꾸로 도는 시계를 멈추기 위해 ‘노동안전보건활동가’가 된 의사들이 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들은 직업과 질병의 관계를 파헤치는 ‘탐정’ 같은 역할을 한다. 일반 의사들이 병원에서 시신과 차트를 보고 사인을 판단할 때 현장을 뛰어다니며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해줄 동료 노동자를 찾으려 현수막을 내건다.
최근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이란 책을 펴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1년 새 두 번이나 동료의 산재 사망을 목격한 후 공황장애에 걸린 70대 노인, 응급실 의사도 부검의도 원인을 찾지 못해 돌연사로 묻힐 뻔했던 23세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죽음, ‘뭘 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열차를 세운 후 ‘제발 발을 먼저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수색한다는 열차 기관사들…. 노동자가 아프고 죽는 것은 그들이 나약하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니다. 위험한 직업을 택하지 않는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판사, 의사, 사무직, 누구든 일 때문에 죽는 세상이다.
지난 2일은 문송면군의 29주기였다. 해마다 이날이면 문군이 묻힌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선 산재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린다. 2017년 그들 앞에서 우리는 말해야 한다. “같이 건강해지는 세상이 되지 않으면 나도, 내 자식도 건강하게 일할 수 없다.” / 정유진 기자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커버스토리] 호텔방에 러닝머신 설치해 봤나요? 아스팔트에 구두약 칠해 봤나요? (2017.6.2) (0) | 2022.03.15 |
|---|---|
| [커버스토리] 의전공화국 (2017. 6.2) (0) | 2022.03.15 |
| [커버스토리] “산재 조사과정서 느낀 ‘그들의 억울함’ 나도 트라우마 생길 정도” (2017.7.7) (0) | 2022.03.15 |
| [창간 65주년 특집]학력·재산·지역별 끼리끼리 인맥 ‘칸막이 사회’ (0) | 2011.10.05 |
| 장애인엔 '짐승우리',유치장.구치소 -'인간이하'수감생활 (0) | 2003.02.14 |




